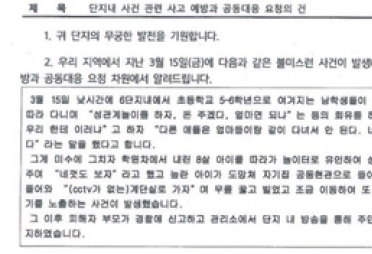1년4개월만이군요. 지난번 서신에서 역대 대통령마다 혹독하게 겪었던 집권 3년차 징크스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아프면 나라도 아프니까요.
1년4개월만이군요. 지난번 서신에서 역대 대통령마다 혹독하게 겪었던 집권 3년차 징크스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아프면 나라도 아프니까요.그런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지금껏 걸어온 궤적이 저와 평행이론 처럼 닮아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드인사는 수첩인사로 치환되고 말았지요. 저는 운동권 정권의 아마추어 정부란 소리를 신물나게 들었는데 님의 정부 역시 세월호ㆍ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으로 같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수 언론의 날선 비판과 여소야대 국회를 견디다 못해 연정과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다가 님으로부터 ‘참 나쁜 대통령’이란 핀잔을 들었습니다. 한데 님도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을 전환하려 개헌과 야권 총리 수용을 통한 연정을 얘기했다가 ‘꼼수’라는 질책을 받아야 했지요.
선의가 독선으로 흘러 나라를 사분오열케 한 잘못도 닮아있습니다. 저는 평생의 화두인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위헌판결로 좌절됐고 결국 행정부처 분할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길위의 공무원’으로 상징되는 국가적 비효율을 낳았습니다. 님께서는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가 나라가 두 쪽날 정도의 진영 갈등을 불러 왔지요.
무엇보다 저를 전율케 한 것은 탄핵소추와 검찰 출두라는 극단적 트라우마까지 공유케 됐다는 겁니다. 오랜 후원자였던 사람이 화근이 됐다는 점도 그렇구요. 제 형님과 아내가 박연차에게 그랬던 것처럼 40여년간 ‘입안의 혀’ 처럼 충정을 다해온 최순실에 무장해제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뻐도 최순실과 청와대 권력을 나눈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고 ‘탄핵소추로 파면된 첫 대통령’이란 멍에를 뒤습어쓴 참담함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저 또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주창한 사람으로서 뇌물 피의자란 낙인을 견딜 수 없어 부엉이 바위에 올랐으니까요. 님이 삼성동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보인 환한 미소는 제겐 피울음을 애써 감추는 모습으로 보여 마음 한 켠이 아렸습니다.
님의 궤적을 앞서 밟아온 못난 선배로서 당부드릴 말씀은 노무현의 길을 버리고 닉슨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과, 국가와, 우리 정부 시스템과,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실망시켰다, 나는 미국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했고, 이것은 내가 평생 지고 가야할 짐이다. 내 정치생명은 끝났다”
닉슨의 이 고백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 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해성사하듯 겸허한 모습으로 설때 우리 국민들은 님의 꿇은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줄 것입니다. 제가 가족과 동지, 지지자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부엉이 바위에 올랐다지만, 결국은 제 자존감을 지키려다 나라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입니다. 님께서는 후임 대통령이 국민적 통합과 치유의 시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부디 밝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mhj@heraldcorp.com

![[단독] “100억 들여 ‘가짜’ 없앤다더니” 믿었던 대표의 배신…알리 짝퉁 ‘분통’](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78&simg=/content/image/2024/04/23/20240423050752_p.jpg)
![“우리 폰에 한국 제품 쓰지마” 지독한 중국…K-OLED 10%대 ‘충격’ [비즈360]](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78&simg=/content/image/2024/04/23/20240423050736_p.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