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재자로서 리더십 중요
축적된 ‘지 0 파’ 인사들 경륜
정권 바뀌어도 지속 활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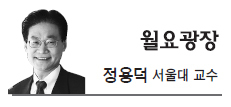 ‘한국전쟁’을 끝으로 전쟁이 사라진 지 60년이 돼가는 이 시점의 동북아시아에 다시금 민족주의와 냉전의 기류가 감돌고 있다. 국력 등의 여건 면에서 그때와 상황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됐던 그 긴장의 분위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을 끝으로 전쟁이 사라진 지 60년이 돼가는 이 시점의 동북아시아에 다시금 민족주의와 냉전의 기류가 감돌고 있다. 국력 등의 여건 면에서 그때와 상황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됐던 그 긴장의 분위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덩치 값을 하기는커녕 여전히 속 좁고 영토 욕심도 많은 이웃나라들을 보건대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세 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 초국가적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보다 깊은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 간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생존해 나아가야 한다. 비록 몸집은 작을지언정 차라리 우리가 이 지역의 평화와 호혜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해 이 나라들에 대해 동등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가능한 많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적 자원과 사회 자본을 적지 않게 쌓아가고 있다. 그런 대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한ㆍ미 관계 67년, 한ㆍ일 관계 47년, 한ㆍ러 관계 22년, 그리고 한ㆍ중 관계 20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기간에 각 나라에 유학했던 학자들을 비롯해 업무상 주재했던 공ㆍ사부문의 실무자들, 특파원으로 종사했던 언론인들이 대표적인 인적ㆍ사회적 자본의 예다. 이들이 각자 주재했던 나라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식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어지간히 축적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대외관계에 대한 정책기조와 정서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 또한 높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지O파(知O派)’로 지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난 세기나 지금이나 한국은 주변의 4대 강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상 최선이다. 그러나 이 소박한 목표를 막상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들 간의 상호 이해관계로 인해 우리가 어느 한쪽 편에 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유연하게 대외정책을 펴야만 한다. ‘상황 적합(contingent)’하게 강성과 연성의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스마트(smart)’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과 사회 자본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동안 축적된 ‘지O파’ 인사들의 경륜이 고르게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영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간단한 원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대외정책결정에 자문했던 전문가 한 분은 그다음 정부의 당국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참고하기는커녕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하더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분이 자문했던 바로 그 정부도 그 이전 정부에서 자문했던 다른 인사들에게 역시 ‘차단’ 수준의 배척을 했을 것 같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국정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도 대개는 ‘지O파’에 해당했을 것이다.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유연하게 이들을 활용했더라면 국가도 살고 그들 또한 모두 공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침하는 외세에 따라 국내의 각 정파들도 국익이 아닌 파당적 이익을 쫓아 제각기 엇박자의 춤을 추었다. 서로를 ‘차단’하고 서로 간에 배척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결국 그들 스스로의 운명 또한 ‘지O파’에서 ‘친O파(親O派)’로 변질돼 나아갔다. 그 결과는 국가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재앙이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진정한 통합의 정치 리더십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역사적 교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