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 스틸컷 (사진=영화제작전원사)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동민 기자] 누구에게나 삶은 녹록지가 않다. 세상은 결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인생사에서는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은 추해지곤 한다. 나를 아프게 한 이를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상대방을 밀어 부치기도 한다. 애증이 교차하는 남녀 관계에서 이는 특히 극명하게 나타난다. 다 큰 ‘어른’이라 해도 많은 경우 연인과의 이별을 앞둔 상황에서는 꼭 어린애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다.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말이다.
‘클레어의 카메라’는 두 여자와 한 남자의 삼각관계를 다룬다. 프랑스 칸 영화제를 찾은 영화감독 소완수(정진영)와 그를 지원하는 배급사 대표 양혜(장미희), 그리고 부하직원 만희(김민희)가 바로 그들이다. 세 남녀는 서로 직장 동료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친구이자 연인 관계이기도 하다. 만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양혜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프랑스인 교사 클레어(이자벨 위페르)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서사가 영화의 큰 줄기다. 영화는 제목대로 ‘클레어의 카메라’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인물들의 속내를 줄곧 건조한 시선으로 가만히 바라본다.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 스틸컷 (사진=영화제작전원사)
주인공 만희를 사이에 둔 채 영화 중간중간 날카롭게 비집고 나오는 양혜와 완수의 진심은 우습고 추하다. 양혜는 수 년간 함께 일해 온 만희를 이역만리 외국 땅에서 단칼에 잘라내고, 뜻 모를 이유를 들어가며 이를 일방적으로 정당화한다. 완수 역시 해고당한 만희를 만나자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잣대 속에 만희를 가두는 태도를 보인다. 좀처럼 속 시원히 설명되지 않은 이들의 ‘폭력’을, 만희는 온몸 그대로 받아내면서도 꿋꿋이 제 갈 길을 간다. 마치 구제불능 어린아이의 억지를 귀찮은 듯 받아내는 것처럼.
홍상수 감독의 전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그랬듯, ‘클레어의 카메라’ 속 캐릭터와 대사들은 가십거리가 된 지 오래인 그의 현실과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다. 프랑스 칸이라는 배경, 그리고 그곳을 함께 찾은 감독과 여배우의 구도는 현실 속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이야기와 떼어 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때문에 선과 악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한심하거나 불쌍하거나 아니면 속을 알 수 없는 인간들로만 채워진 그 세계는 더할나위 없을 만큼 현실적이다.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극 중 완수의 말처럼, 감독은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대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진다.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 스틸컷 (사진=영화제작전원사)
이렇게 모호하기만 한 영화에서 유일하게 분명한 존재는 클레어, 더 정확하게는 그의 작은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찍힌 인물 사진이다. “내가 당신의 사진을 찍고 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클레어의 말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찰나를 담아낸 사진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단면 그 자체가 된다. ‘클레어의 카메라’가 포착한 만희와 완수, 양혜의 순간처럼, 관객 역시 인과 관계와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 장면장면을 단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다. 어쩌면 영화 스스로 카메라가 되어 팔짱을 낀 채 스크린 밖 관객들의 표정을 보며 킥킥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4월 25일 개봉.
culture@heraldcor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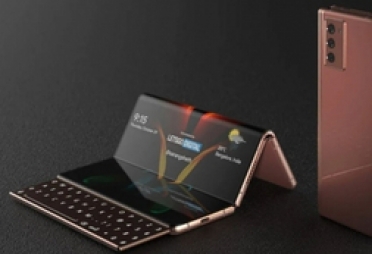

![“넌 평생 공짜야”…현금 122만원 찾아준 여고생에 벌어진 일 [영상]](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78&simg=/content/image/2024/04/26/20240426050241_p.jpg)
![“왜 공무원이 치워?” 선거 현수막, 신나게 걸더니…끝나면 ‘아 몰라’ [지구, 뭐래?]](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78&simg=/content/image/2024/04/25/20240425050849_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