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 발전 300년은 신의 대리자 찾기 이성·문화 확장 불구 ‘구원’엔 답 못해 9·11테러, 자본주의 정점서 神 재소환 “예수의 방식으로 약자들과 연대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종교가 없다는 비종교인은 최근 10년새 10%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10명 중 4.7명에서 5.6명으로 는 것이다. 믿음의 상실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경우, 61%가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 중 29%만이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대답했다는 조사가 있다.
신의 존재 논쟁은 2006년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후 판정승이 난 것 처럼 보인다. 과학적 합리주의가 믿음의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과학이나 문화, 이성 등은 신이 떠난 자리를 충분히 메워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비평가이자 당대 최고의 문화비평가인 테리 이글턴은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알마)에서 신이 사라짐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신의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한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19세기 낭만주의를 거쳐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9·11테러까지 다양한 개념과 이슈, 사상을 훑어내면서 신이 어떻게 배제되고 다시 살아났는지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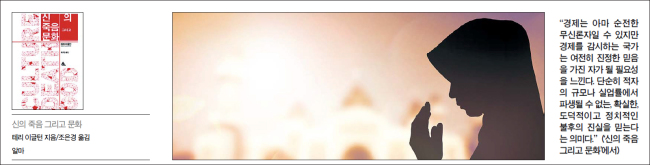
저자는 지난 300여년의 인간의 지성과 문명의 발달을 ‘신의 대리자 찾기’로 본다.
종교의 힘이 약화되면서 신과 종교가 가진 다양한 기능이 분산된 것이다. 가령 계몽주의의의 도래로 과학과 이성은 종교의 권위를 대체했으며, 급진적 낭만주의 시대에는 예술이 신의 대리자 역할을 맡으려 했다. 민족주의에서 아방가르드까지 문화와 정치의 혼합물은 기존 질서의 토대를 흔들었다. 과학, 철학, 문화, 정치는 종교의 일정부분을 감당하며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들이 종교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 구원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신의 대리자로서 탁월함을 발휘해온 문화를 예로 들면, 구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문화는 사회적 분열을 화해시키기보다는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일단 논쟁이 문화개념 자체에 침투하기 시작하고 가치, 언어, 상징, 연대감, 유산,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가 정치적 문제로서 무게가 실리게 되면 문화는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며, “한 편의 이익에 대항하는 공동의 대안으로서 문화가 제시될 수 없다.”고 말한다.
신의 본격적인 재등장은 냉전의 종식, 선진자본주의의 승리의 끝에서 소식이 들려온다. 무신론의 바탕 위에 서있는 선진자본주의의 한가운데서 솟아났다는데 아이러니가 있다. 9·11테러는 바로 신의 귀환을 알린 사건으로지목된다.
저자는 이를 “완전히 무신론적인 문화, 더이상 초조하게 신을 위한 플레이스 홀더를 찾으려 하지 않게 되자마자 신이 맹렬한 기세로 중요 안건으로 되돌아왔다”고 썼다.
저자는 이슬람 원리주의 근원을 혐오라기보다 불안감으로 본다. 새로운 세상에 의해 쓸려나갈지 모른다고 느끼는 병적인 마음이다. 서구 자본주의는 세속주의뿐 아니라 원리주의를 낳는데도 일조한 셈이다.
그렇다면 신의 전쟁에서 서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저자는 인류의 성공한 상징체계로서의 종교에 대한 믿음을 좀 달리 끌고 간다.
저자는 무신론자들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 종교를 이용해온 모순에 주목하며, 종교적 믿음이 사회 질서의 실존을 위한 일련의 근거를 제공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정치의 비판자로서 진정한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삶의 형태가 정의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려면, 다름아닌 예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급진적 소멸’이라 부른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의 결속을 말한다. 믿음이 실종된 시대에 종교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제시한 책이다.
이윤미 기자/
![비정규군 소탕 전문 AC-130J 고스트라이더 [오상현의 무기큐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22/news-p.v1.20241121.8f4980faf64443e195678f2bb3f614ad_R.png?type=h&h=640)
![“XX의 아들”에서 유명 작가된 소재원…노숙인 시절 만난 서점 직원 찾는 이유[우리사회 레버넌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19/news-p.v1.20241118.4159b875eef348079f99ce93cedf37b5_R.jpg?type=h&h=240)




























![“父는 죽고, 친모와 결혼하고” 재앙같은 예언…당사자 아들의 기구한 사연[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오이디푸스 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22/news-a.v1.20241122.6f410829d2e847798d1f6f02d6796a42_T1.jpg?type=h&h=320)




![연예인에 빠져…“24개월 할부로 사더니” 전부 쓰레기통 행 [지구, 뭐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20/news-p.v1.20241120.bf9d50d5065347f3ba37696b2898bb31_T1.jpg?type=h&h=320)
![집 너무 안팔리자 아내가 꺼낸 말 “여보, 상가랑 아파트 바꿀까?”[부동산360]](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16/rcv.YNA.20241105.PYH2024110509190001300_T1.jpg?type=h&h=320)
